왜 '가신 님'에게 길을 묻는가
한국일보 | 입력 2009.06.02 03:35 | 수정 2009.06.02 08:57 | 누가 봤을까? 10대 여성, 광주
영역 달라도 인간적 면모 공통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로 나라가 들끓었던 지난달 31일. 고 김수환 추기경이 잠든 경기 용인 천주교 성직자 묘역에도 왜관 안동 청주 등 전국 각지에서 1,900여명이 방문해 고인을 기렸다. 장례기간 40여만명의 조문 후에도 추모 열기는 식지 않아, 선종 105일째인 1일까지 묘소 참배객은 7만2,100여명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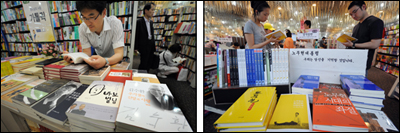
↑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가톨릭 코너에 진열된 고 김수환 추기경 관련 서적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왼쪽사진). 최근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적을 모아 놓은 코너가 등장했다. 김주성기자 poem@hk.co.kr 홍인기기자 hongik@hk.co.kr
추모 열기로 뜨거웠던 지난 한 주간의 또다른 주인공은 고 장영희 서강대 교수였다. 지난달 암 투병 중 세상을 뜬 그의 유작 <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 이 출간 3주만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것. 14주 연속 정상을 지켰던 신경숙씨의 소설 < 엄마를 부탁해 > 를 밀어내고 출판가를 점령했다. 세 고인들의 활동영역과 유산은 제 각각이지만, 이들을 향한 남은 자들의 연정은 엇비슷하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추모 열기는 단순한 애도를 넘어 '고인(故人) 연모(戀慕) 신드롬'이라 할 만하다. 정신적 가치의 상실감과 현실 사회에 대한 실망감이 투영된 이 같은 현상을 두고 "고인들이 한국 사회를 움직인다"는 진단까지 나온다.
올 들어 잇따라 타계한 세 고인은 '종교' '문학' '정치'라는 상이한 영역에서 엇갈린 행로를 걸었던 추기경, 교수, 대통령. 직함은 극과 극을 달렸지만, 인간적 빛깔은 무척 닮았다는 의견이 많다. "세 분 모두 전통적 엘리트와 거리가 먼, 인간적이고 서민적인 면모를 가졌다."(신광영 중앙대 교수), "솔직하고 소박한데다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인간적 가치를 지향했던 이들"(조옥라 서강대 교수)이라는 평가다. 노 전 대통령이나 김 추기경 모두 탈 권위적이면서 소탈한 성격으로 정평 나 있고, 장 교수 역시 "주체 못할 명랑함에다 학생들의 이름 하나 하나 세심하게 기억하는 따뜻한 스승"(제자 김정진씨)이었다.
무엇보다 어려운 역경에서 자신만의 '가치'를 굳게 지켰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낙선을 거듭하면서도 '지역정치 극복'에 인생을 걸었던 '바보' 대통령, 모진 병마와 장애에도 '희망'의 노래를 멈추지 않았던 '희망의 메신저' 교수, 엄혹한 세월에서도 용기와 사랑을 잃지 않았던 추기경이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는 "말은 쉽지만, 현대 사회에서 지키기 힘든 진정성"이라고 말했다.
팍팍한 현실에 부대끼는 현대인에게 이들의 갑작스런 죽음은, 결국 잃어버린 가치를 새삼 일깨워주는 '벼락'이 됐다는 해석이다. "물이 부족할 때에서야 물의 소중함을 아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실제 시민들의 뒤늦은 각성은 "그 분의 뜻을 따르고 싶다"는 유지 계승으로도 확산되는 추세다. 각막을 기증한 김 추기경의 뒤를 잇는 장기기증 서약은 선종 후 5만 명을 넘어섰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따르면 3월 4,400명이던 서약자는 4월 6,000여명으로 늘었다. 반짝 늘었다가 이내 사그라지는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죽음에 임박한 사람까지 범위를 가리지 않고 기증 서약자가 늘고 있다"며 "김 추기경처럼 '의미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게 핵심 동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고인 연모 열기는 역으로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는 가치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점에서 남은 자들에게 쉽지 않은 과제를 던지고 있다. 황상민 연세대 교수는 "현실에서 정신적 모델로 삼을 만한 지도자가 더 이상 없다는 갈증이 고인에 대한 상실감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대엽 고려대 교수는 "도덕적 가치 상실감을 어루만지고 새로운 에너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
장재용기자 jyajng@hk.co.kr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MY ESSAY > 일상의 단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휘목펜션에서 (0) | 2009.12.28 |
|---|---|
| 풍경 ( 정암사, 만항재, 함백산 ) (0) | 2009.07.06 |
| 아~아 당신을 보내고야 말았습니다. _09.05.29 (0) | 2009.05.29 |
| 故 노무현 전직 대통령의 서거 즈음에.. (09.05.23) (0) | 2009.05.25 |
| 노무현 전직대통령의 소환에 즈음하여~ (0) | 2009.04.30 |